연구 및 발표자료
 >
>
- 자료실 >
- 연구 및 발표자료
| 백운컬럼89 어머니 꽃 구경 가요 | 운영자 | 2025-04-07 | |||
|
|||||
|
어머니 꽃 구경 가요 백운 이배근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 핀 봄날, 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구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구경 꽃구경 눈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하시나요. 꽃구경은 안 하시고 뭐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하시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소리꾼 장사익이 부르고 시인 김형영이 지은 ‘따뜻한 봄날’이다. 두터운 마분지에 싸고 또 싸서 속엣 것보다 포장 더 무겁게 담아 보낸 소포 끈 찬찬히 풀다 보면, 낯선 서울살이 찌든 생활의 겉꺼플도 하나씩 벗겨지고, 오래된 장갑 버선 한 짝 해진 내의까지 감기고 얽힌 무명실 줄 따라 펼쳐지더니, 드디어 한지 더미 속에서 놀란 듯 얼굴 내미는 남해 유자 아홉 개. “큰 집 뒤따메 올 유자가 잘 댔다고 몇 개 따서 너어 보내니, 춥을 때 다려 먹거라. 고생 만앗지야. 봄 볕치 풀리믄 또 조흔 일도 안 잇것나. 사람이 다지. 아래를 보고 사는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드시 몸만 성히 추스르라.” 헤쳐 놓았던 몇 겹의 종이 다시 접었다 펼쳤다 밤새 남향의 문 닫지 못하고, 우연히 콧등 시큰거려 내다본 밖으로, 새벽 눈발이 하얗게 손 흔들며 글썽글썽 녹고 있다. 고향 어머니께서 맞춤법도 안 맞지만, 삐뚤삐뚤 써보내신 편지가 담긴 고두현 시인의 ‘밤에 온 소포’의 일부다.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어머니의 사랑은 불타도 연기가 없다. 스탕달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란 스승이자 나를 키워준 사람이며, 사회라는 거센 파도로 나가기에 앞서 그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방패 막 같은 존재다.”꽃피는 봄은 오고 있는데, 세상에 계실 때, 그 흔한 해외여행은 커녕 꽃구경 한번 제대로 못시켜드린 어머니를 생각하면 나는 늘 가슴이 메어 온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는 전승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기념하는 탑이다. 그러나 그 전승탑은 다른 나라의 것처럼 개선장군의 늠름한 조각상이 아니라 언덕위에 팔을 벌리고 서있는 어머니의 조각상(母像)이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이 조국을 지켜내고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그림 같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인가? 제1차 세계대전 전쟁터에서 수없이 죽어간 프랑스 군인들의 마지막 말은 조국 프랑스 만세가 아니리 어머니였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려도 한 가지만 남는다면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1951년 모윤숙의 ‘전쟁터에 아들을 내보낸 어느 어머니의 기도’는 읽을 때마다 어머니와 조국에 대한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높이 잔물지는 나뭇가지에 어린 새가 엄마 찾아 날아들면, 어머니는 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산 위 조그만 성당 안에 촛불을 켠다. 바람이 성서를 날릴 때 그리로 들리는 병사의 발자국 소리들! 아들은 지금 어느 산맥을 넘나보다. 쌓인 눈길을 헤엄쳐 폭풍의 채찍을 맞으며, 적의 땅에 달리고 있나 보다. 애달픈 어머니의 뜨거운 눈엔 피 흘리는 아들의 십자가가 보인다. 주여! 이기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두 손을 꼭 쥐고 있다. 난생처음 세상의 밝은 빛으로 눈이 부셨던 그 첫날 아기는 눈도 뜨지 못하고 발도 제대로 꼼지락거리지 못하면서도 그 작은 손바닥 안에 꼭꼭 감추어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아기는 열 달 동안 어머니의 뱃 속에서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도 한 가지만 남는다면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1865년 혹독한 겨울, 영국 사우스 웨일즈 언덕에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던 여인은 길을 잃고 갓난아기를 안은 채 숨을 거두었다. 얼마 후 이웃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죽은 여인은 거의 속옷 차림이었다. 자신의 속옷까지 모두 벗어 아기의 몸을 돌돌 감쌌던 것이다. 사람들이 그 옷을 벗겼을 때 놀랍게도 아기는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 아기가 바로 1916년 대영제국의 총리로 제1차 세계대전 후반을 이끌었던 정치가 로이즈 조지였다. 아시아 최대의 정치가이며 세계적인 민주주의적 통치자였던 라몬 막사이사이가 태어난지 16개월 만에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 떨던 괴질에 걸려 의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 생명을 포기하라고 했다. 의사가 돌아간 다음 마침 그런 괴질에 특효약이 발견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읽은 어머니는 마땅한 교통수단도 없던 당시 죽어가는 신생아인 아들을 살리기 위해 집에서 500리(200km)나 떨어진 마닐라까지 걸어가서 마침내 그 약을 사고 다시 500리를 걸어 집으로 와서 아들에게 그 약을 먹이고 아들을 살렸다. 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없었다면 위대한 정치 지도자 막사이사이는 나타날 수 없었다. 엄마는 다급할 때 외치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며, 슬플 때 기대어 울 수 있고, 상처가 나면 ‘호호’ 불어주고,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존재다. 박목월 시인의 시 ‘어머니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철없던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을 추억하게 한다.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진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락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길 곧게 걸어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 눈에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흔들리는 불빛. 20여 년 전 둘째 아들 결혼을 앞두고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를 평창동 요양원에 잠시 보내드렸다가 얼마 후 급한 전화를 받고 요양원에 들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오는데 내 등에 업힌 어머니가 그렇게 가벼우실 수가 없었다. 나는 독일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나이 어머니’라는 시를 읽을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가에 이슬이 맺힌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사람들은 어머니를 땅속에 묻었다. 꽃이 자라고 나비가 그 위로 날아간다. 어머니의 몸이 가벼워 땅은 거의 눌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가벼워질 때까지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까!” 어머니를 잃은 아이는 문고리가 없는 문과 같다. 문고리가 없으면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프랑스 군인들이 죽으면서 가장 많이 외친 것은 국가가 가르친 “프랑스 만세”가 아니라 ‘어머니’였다고 한다. 이덕무(李德懋 1741-1793)가 쓴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에 “내가 갑신년 섣달그믐날 밤 시를 짖다. 소자의 소원은 무엇이던가. 내 어머님 폐병이 낫는 것일세. 폐병은 기침병이다. 지금도 슬픈 생각이 들어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어머님의 기침 소리가 은은하게 귀에 들리는 것만 같다. 그러나 사방을 둘러봐도 돌아가신 어머님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눈물이 얼굴을 적신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신다면 섬기기를 다하시고, 하늘나라에 계신다면 영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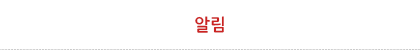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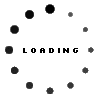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