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발표자료
 >
>
- 자료실 >
- 연구 및 발표자료
| 예리한 지능보다 무딘 성실을 (이배근 회장) | 관리자 | 2023-11-29 | |||
|
|||||
|
예리한 지능보다 무딘 성실을 이배근(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미국의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은 캘리포니아의 초•중등학교 학생 25만 명중에서 지능지수 135를 넘는 1,521명을 가려내 35년간 추적하는 종단연구를 하였다. 결과는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매우 평범한 인생을 살았으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터먼의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주어진 지능보다 개발하는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실과 정직, 나눔의 정신과 같은 덕목을 추구하는 성품지향적 사람들은 거짓말 안하고, 손해 보더라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솝이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반짝이는 토끼의 잔꾀가 우직한 거북이의 성실성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이끌어온 수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바로 성실이라는 좋은 성품을 개발하여 평생을 꾸준히 실천했던 사람들이었다. 예리한 지능보다 무딘 성실이 청소년의 미래를 결정한다. 한 청년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뉴욕박물관에 임시직으로 취직하였다. 청년은 늘 남보다 한 시간 먼저 나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열심히 박물관 마룻바닥을 닦았다. 어느날 박물관 관장이 그를 보고 말했다.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바닥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청년은 대답했다. “이 곳은 뉴욕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자신의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일에 열성을 다한 청년은 성실성을 인정받아 마침내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훗날 뉴욕박물관 관장을 지낸 저명한 고래 연구박사 로이 앤드루스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성실이라고 한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말이다. 성실은 좋은 사람의 대표적 성품이다. 성실성을 판단하는 잣대는 신뢰성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책임을 지기보다는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와는 달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생을 배우는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잣대는 정직이다. 성실한 사람은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은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며, 항상 진실의 편에 서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사람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며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다. 워싱톤과 링컨은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매우 정직한 대통령들이었다. 벚나무를 도끼로 찍어 넘어뜨린 후 큰 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호통 치는 아버지 앞에 나가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백한 어린 시절의 워싱톤과 추운 겨울날 밤 계산이 잘못되어 물건 값을 더 내고 간 부인을 찾아 왕복 30리가 넘는 길을 걸어가 거스름돈을 돌려준 청년 링컨의 정직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 사무엘 콜리지는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그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라고 충고한다. 사람들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그보다는 아름다운 인격을 지닌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성실과 정직은 인격을 이루는 주춧돌이다. 동양의 이상적 인간상인 군자는 인생을 능숙하게 살기보다는 정직하고 꾸밈없이 사는 사람이었다. 성실을 근본으로 하는 사람을 군자라 하고 위선을 근본으로 하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하였다. 민족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암담했던 시절 도산 안창호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중요한 이유로 성실과 정직의 부족을 들면서 나라의 근본 바탕을 이루는 성실과 정직을 익히고 실천할 것을 당부하였다. 성실은 또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율곡은 성실(誠實)의 성(誠)이 말(言)한 바를 반드시 이르도록(成)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반드시 정성스럽고 믿음직스럽게 실행할 것을 가르쳤다. 율곡의 교육사상의 핵심은 성실이었고 그가 추구한 대동세계(大同世界)는 성실과 믿음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사회,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는 이상적인 사회였다. 성실한 사람은 말로나 행동으로 나를 속이지 않는 동시에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성실이다. 근면과 성실을 가장 높이 평가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고 이제는 개인의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며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신하는 시대가 왔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사람이 걷는 것은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시대가 변한다 하여도 지능지수(IQ)보다 공감지수(EQ)가 개인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아주 작은 구멍으로 스며든 햇볕 한 줄기가 온 방을 밝히듯이 한 줌의 성실이 무더기의 지능을 덮고 세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나날의 생활에서 조금씩 성실을 닦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순수한 마음과 성실로서 맡은 일에 전념하려는 사람을 세상은 유약한 사람이라고 하며, 법을 어기지 않고 원칙대로 살려는 사람을 옹졸하다고 폄하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나 거짓과 불의와 부정이 없는 희망찬 나라는 성실과 정직을 평생의 친구로 삼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칭찬과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오늘의 성실한 청소년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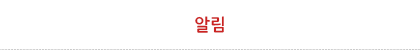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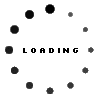
댓글 0